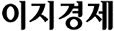[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내 건설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저마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전통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중동을 비롯해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을 적극 공략하면서 활발한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는 최근 중동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아프리카는 낙후된 인프라와 부족한 전력 등으로 잠재적 건설 수요가 풍족해 이미 중국과 유럽 업체들이 상당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중국은 엄청난 자본 투자로 토목·건축 부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시장의 현황과 위험 요인 분석, 대응 방안 등을 살펴봤다.
◆ 저조한 도로·공항·전력 인프라, 건설 수요 충분
아프리카의 인프라 발달 정도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 도로의 경우 상품수송의 80%, 승객 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나, 도로 포장비율은 22.7%에 불과하다. 고속도로는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1970년대 초반부터 건설이 추진됐으나, 투자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건설되지 못한 상황이다. 식민시대에 대부분 건설된 철도도 내전 등으로 상당부분이 파괴된 채 방치돼 있다. 또 4000여 개의 공항 중 포장된 활주로를 갖춘 공항은 20%에 불과하다.
특히 아프리카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발전소 및 송배전망의 미비 등으로 ‘전력 위기’에 빠져 있다. 전력 인프라의 객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인구 100만명당 전력생산 용량은 70MW로 남아시아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 토목·건축은 중국이 주도, 한국기업은 플랜트에 집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건설 플랜트 시장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의 비중은 5%에 불과하며 한국 기업의 지역별 수주 비중(2011년 기준)을 보면 아프리카는 4%에 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 건설 붐이 조성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건설업 성장 증가율은 13.2%로, 경제성장률(4.6%), 농업성장률(3.4%), 공업성장률(4.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앙골라(44.8%), 콩고(24.5%), 수단(22.3%) 등 산유국이 아프리카 건설 플랜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국가별 수주 비중을 보면, 역시 산유대국인 나이지리아가 5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가나(13.4), 앙골라(10.9%), 적도기니(4.6%) 순이다.
아프리카에서의 공종별 수주비중을 보면, 플랜트 분야(87%)가 절대적으로 높다. 토목과 건축 분야는 각각 3%, 7%로 이 분야에서는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쥐고 있는 것과도 큰 연관이 있다.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주로 메이저 기업과의 협력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외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수주비중(2011년 기준)을 보면 역시 중국이 38.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16.5%), 프랑스(9.7%) 등으로 유럽이 37.2%를 차지하고 있다.

◆ 대부분 국가신용도 낮아 안정적인 금융 확보 필수
아프리카 건설 플랜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사업리스크가 높고 국가신용도가 매우 낮은데, 국가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로 단기 상업대출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중장기 자본이 필요한 에너지 및 수송 인프라 등 대규모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신상섭 해외건설협회 실장은 “중동 펀드나 국제개발은행(MDB) 등 외부 금융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관 시장개척단 파견,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다국적 에너지 기업과의 제휴, 정보네트워크 강화, 아프리카 진출 전담기구 설립도 요구되며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발주처 인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컨소시엄을 통한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진출은 리스크 분산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우리 업체의 진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계 주요국 기업들은 막강한 기술력 및 자금력, 오랜 진출 역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자원개발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유지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은 선진 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 중국기업과 경쟁보다는 협력 필요
안정적인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 건설사들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3차 아프리카 건설 포럼에서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팀장은 “중국 정부는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아프리카 건설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의 원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누계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원조 규모는 400억 달러 가량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83억 달러가 아프리카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 남광토건 등이 아프리카에서 신도시나 플랜트 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지만 매년 10억 달러 내외의 수주에 그치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설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보다는 동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아프리카에서 발주되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한·중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공사는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